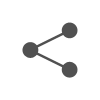죽음(입관) 체험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다. 끝까지 붙잡고 싶어도 잡히지 않는게 목숨이다. 죽음을 경계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막을 수도 없다.
지난 2009년 우리 사회에는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웰빙'(Well-being)에서 ‘품위 있게 죽자’라는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급속하게 퍼졌다.
이런 죽음에 관한 트랜드를 취재하다 ‘죽음(입관) 체험’이라는 색다른 경험을 했다. 같은해 5월26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사생체험연구소에서 실시됐다.
입관 체험은 영정 사진을 찍는 것에서 시작됐다. ‘영정 사진’이라는 말에 왠지 거부감부터 들었다. 얼굴은 잔뜩 굳어지고 마음은 찝찝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웃는 모습이 좋다”라고 말했지만 도무지 ‘미소’가 머금어지지가 않았다.
실내의 전등이 모두 꺼졌다. 까만 어둠 속에서 내 앞에 촛불 하나만 켜지고 거기에 임종 노트가 놓여 있었다. 임종 노트는 일종의 유언장인 셈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싶은 것들을 떠올리며 한 줄 한 줄 써내려갔다.
깊은 한숨과 생각을 반복하며 가까스로 임종 노트를 완성할 수가 있었다.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것은 죽을 준비가 다 됐다는 것을 뜻한다.
무표정한 영정 사진을 직접 들고 지하의 모의 장례식장으로 이동했다. 모의 빈소는 실제 장례식장과 똑같이 꾸며져 있었다. 꽃으로 치장된 빈소 위에 영정 사진을 올려놓고 수의를 입고 짚신으로 갈아 신었다.
빈소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고, 실내 공기는 싸늘했다. 어디에선가 음산한 장송곡이 들려오자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다. 순간 ‘내가 진짜 죽었구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갑자기 울컥하며 눈시울이 어른거려왔다.
빈소 뒤에 있는 목관으로 이동하자 내 손과 발을 꽁꽁 묶었다. 눈에는 안대를 씌웠다. 그리고 관에 누웠다. 그런데 세상의 근심 걱정을 모두 벗어버린 듯 관 속은 너무도 편안했다. 그때 처음 ‘죽는 것은 휴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 드르륵 하며 관 뚜껑이 닫히고 못 박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그리고 긴 침묵이 흘렀다. 한 10분 정도 관 속에 누워 있는 동안 온갖 생각이 뇌리를 스쳐갔다.
어릴 적부터 학창 시절 그리고 지금의 모습까지 파노라마 영상으로 지나갔다. 때로는 후회하고 또 아쉬움과 미련이 있었다. ‘어차피 빈 몸으로 가는 것을 왜 이렇게 욕심을 내고 부딪치며 살았을까.’
‘죽음’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것 같다. 다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어떤 모습으로 생을 끝마칠 것인지가 중요하다. 열심히, 착하게 살면 죽음도 그만큼 편안하고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